인터내셔날 헤럴드 트리뷴(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주말판에 위의 제목과 비슷한 내용의 글이 실렸다. 원제는 "왜 수도 없이 많은 디자인들이 실패하는가(Why the overwhelming numbers of design flops)?"이다. 런던의 디자인박물관(Design Museum) 관장이자 저명한 디자인 비평가인 앨리스 로쏜(Alice Rawsthorn)이 쓴 기사인데, 광고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실패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한 번 비교하며 살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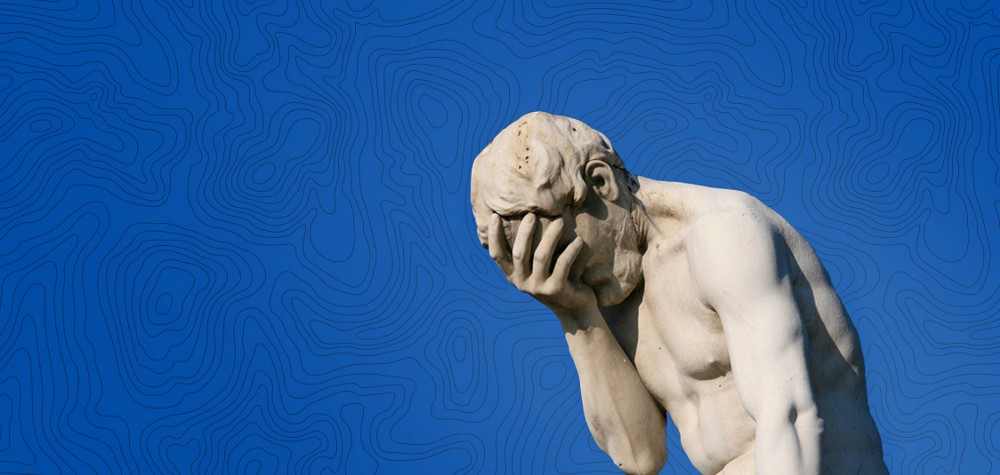
1. 디자이너끼리만 알아 주는 디자인(Designing for other designers)
로쏜은 자동차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인구의 반 이상이 여성인데, 디자이너들은 대부분이 남성이라 남성 위주의, 외형에만 치중한 디자인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이다. 아주 오래된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부류의 경험이 있다.
주방세제 광고를 기획하는데, 가장 닦기 힘들고 시각적으로도 확 눈에 띄는 기름기를 찾아야 했다. 삼겹살을 후라이팬에 구워 먹고 난 후의 기름찌꺼기에 이구동성으로 박수를 치며 동의했다. 보기만 해도 역겨운 둥둥 뜬 기름이 세제를 뿌리고 한 번 쑤세미질로 뽀얗게 닦이는 그림도 실감나게 나왔다. 주부 모니터들을 대상으로 의기양양해서 광고를 보여주자, 아주머니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얘기했고 이구동성으로 거들었다. "휴지로 닦아야지, 그걸 왜 바로 세제를 뿌리고 그러죠?" 그 순간 어리둥절하며 서로를 바라보는 스탭들 속에 여성은 아무도 없었다. 군대 시절 지나서는 설거지 한 번 제대로 해 본 적 없는 마초급 남성들만 입맛 다시며 삼겹살 굽는 장면 떠올리며 서로 격려하고, 기름 둥둥 뜬 장면 만들고 했던 것이다.
2. 과시하고 싶은 유혹
로쏜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얘기했다. '변화 그 자체를 위한 변화 주기(Change for change's sake)', '(소비자에게) 부담 주기(They made us do it)', '기술혁신 그 자체를 위한 혁신(Innovation for innovation's sake)'. 세 가지 모두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변화를 진보나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하면서 고전적인 디자인의 에스프레소 제조기에 라떼 등을 제조하는 기능을 집어 넣으면서 흉물스럽게 만들고, 별로 쓰지도 않는 기능들을 계속 첨가하여 사용자들이 쓰기만 힘들게 만든 휴대전화, 무엇이 좋은지 그래서 왜 만들었는지 아리송한 핸들이 앞뒤로 달린 사이드웨이바이크(Sideways Bike)를 예로 들었다.
브랜드 쪽으로 오면, 영어로 'That's too much!'라고 하는, '오버하지 말자'의 '오버'하는 경우들이다. 아직도 인구에 회자되는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나이키가 했던 '당신은 은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금메달을 놓친 것이다' 따위의 광고가 이런 데 해당된다. 나이키를 신는 사람들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상대를 눌러 버린다는 것으로 오버 해석하였다. 역시 물의를 빚었던 '피 묻은 군복', '신부와 수녀의 키스'와 같은 베네통의 광고도 베네통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색상의 자유로부터 기존 관념의 탈피로의 확장이 도가 지나쳤던 경우이다.
3. 환경과 같은 시류에만 맞다면(As long as it's green)
환경과 같은 사회적 가치, 기업의 영속성(Sustainability)를 위한 가치는 절대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결함이 있는 디자인이 용납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강하게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다른 한 편으로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따라 소비자들이 기존의 절대적인 디자인관과 다른 각도에서 디자인을 평가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다.
아웃도어 의류를 만드는 파타고니아(Patagonia)는 옷들을 제조하고 남은 천조각들을 모아서 그야말로 누더기 옷을 만들어 팔았다.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에 부합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 왔던 파타고니아이기에 누더기는 쓰레기를 줄이려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디자인으로 인식되어 사계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파타고니아 정도의 노력과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명분이 좋은데' 식의 변명은 통할 수 없다.
4. 위원회에 의한 의사결정(Design by Committee)
정말 치명적이다. 디자인도 그렇고 광고나 회사 로고, 슬로건 등을 결정하는데 가장 벙벙한 안이 뽑히게 된다. 로쏜은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면서 한 장면 넘어갈 때마다 몇 가지 안들을 가지고 소비자조사를 해서 가장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이야기를 선택하며 넘어가는 식이라고 한숨을 짓는다.
지금도 사전조사라는 형태로 몇 개의 대안들을 내놓고 소비자 선호도 투표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말 그런 경우를 당할 때마다 피눈물이 솟는 듯한 느낌이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역시 많이 일어난다. 누가 봐도 확실한 것을 한 사람이 뒤집어 버리는 일도 많고 역시 피눈물이 난다.
5. 하여간 뭔가 바꾸어야지(Up, up and away)
조급증에 걸린 경영층이 괜시리 일을 만드는 경우이다. 기업 로고나 슬로건이 CEO가 바뀌자 바로 바뀌는 경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앞서서 본 '변화 그 자체를 위한 변화'의 경우로 바꿀 경우 '구관이 명관'이란 속담을 떠올리게 된다.
원조, 전통이라는 아무도 따라 올 수 없는 자산을 내던지고, 정말 어린 애들과 진흙탕 싸움을 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다. 오랜 브랜드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는 노력은 이해가 되나 그것이 모든 자신의 자산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6. 다른 애들에게 잘 통했잖아(But it worked for them)
경쟁자가 성공했다고 무조건 따라 하는 디자인들을 말한다. 로쏜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브랜드를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모방의 유혹에 빠지고, 압력에 시달리게 된다. 자신에게 어떤 디자인이 맞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광고도 마찬가지이다. 왜 어떤 유형의 광고가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지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다. 연예인 하나가 떴다 싶으면 우루루 몰리는 현상 역시 이런 중심축이 없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 기준, 중심축이 바로 브랜드이다.
@ 알루스토리(alloo.tistory.com/166)
'Topic > 읽어봤으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디자인서적] 프로그 - 애플을 디자인한 천재 디자이너의 이야기 (0) | 2021.01.20 |
|---|---|
| [2010.04] 다시 디자인을 생각하며 (0) | 2021.01.20 |
| 디자인으로 사는 세상, 디자인의 새로운 역할 ① (0) | 2021.01.20 |
| 디자이너들을 위한 퍼스널 브랜드의 중요성 (0) | 2021.01.19 |
| 냉정한 호흡만이 깊이를 디자인한다. (0) | 2021.01.15 |
| 온-오프라인에서의 브랜드 이미지 포지셔닝(Brand Image Positioning) (0) | 2021.01.15 |
| 2011년 마케팅 트렌드-스마트(Smart) , 소셜(Social), 터치(Touch), 착한(Cause) (0) | 2021.01.15 |
| 오브제, 콜라주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0) | 2021.01.12 |